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시도 할 경우에 3가지 측면을 검토한다. 대체안이 있느냐, 보상은 어떤 것이냐, 결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들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충동적이고 계산적이지 못해서 이익만을 크게 생각한다(홍성열. 2002: 271-288).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손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범죄행동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왜 범죄를 저지르며, 어떤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는 것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연구하는 것이 범죄심리학이다(大村政商 2001: 186).
오윤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박영사, 201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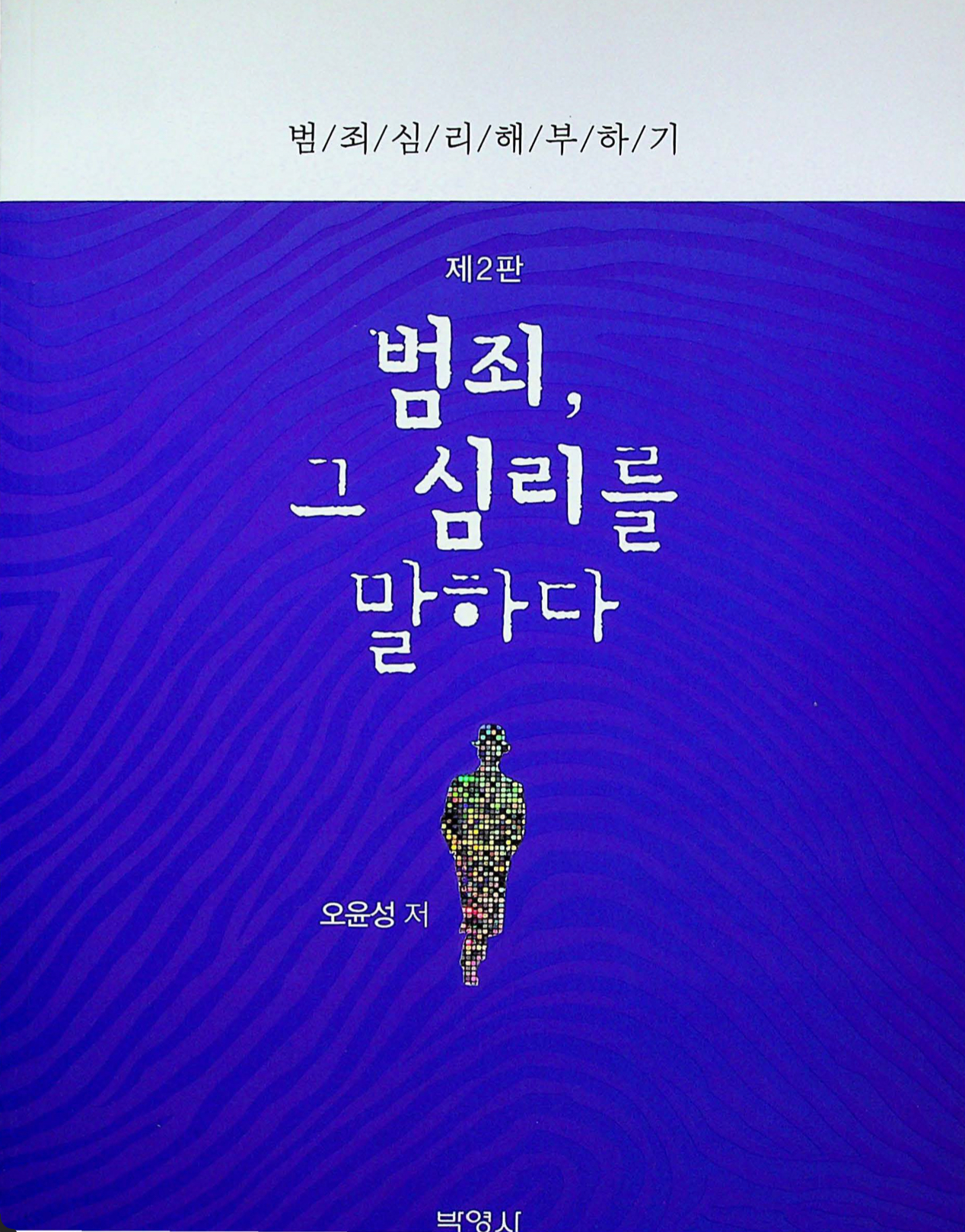
It is useful to think of criminal activity as being part of a process rather than a particular action or an act committed by a particular type of person. The process starts when people carry out illegal acts, but even those acts are likely to have their roots in earlier experiences. Once the act has been committed there are then victims and witnesses, as well as other social processes that become associated with the act, most notably aspects of law enforcement. Thus an important aspect of the process that emerges if the criminality is recognized and reported is the police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 criminal is likely to be part of various social networks that will also influence and be influenced by the crime. Other crimes may also be associated with the initial act so that the crime itself can become part of a developing process of criminality.
Psychologists focus on individuals rather than broader social, political or economic processes so the knowledge that is gained about the psychology of crime has to be gleaned in relation to the acts of offenders rather than general crime statistics. This means that the task of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cognitive, emotional and interpersonal aspects of the criminal process is very dependent on which crimes and criminals it is possible to obtain information about. Psychologists cannot glean very much from the sort of national crime statistics that are the stock in trade of those sociologists who study crime. To understand the individual and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rimes, details of actual crimes and their perpetrators need to be obtained.
범죄 활동을 특정 행동이나 특정 유형의 사람이 저지른 행위로 보기보다,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시작되지만, 그러한 행위조차도 이전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생기며, 법 집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과정이 그 행위와 연관되게 된다. 이에 따라, 범죄가 인지되고 보고가 되어 나타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경찰 수사다. 게다가, 범죄자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범죄가 주고 받을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데, 초기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범죄가 나타나는 등, 범죄 자체가 범죄의 발전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보다 넓은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과정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므로, 범죄심리학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인 범죄 통계보다는 범죄자의 행위와 관련된 정보여야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범죄 과정의 바탕에 있는 인지적, 정서적, 대인적 관계를 이해하는 과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범죄와 범죄자에게 매우 의존적임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범죄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의 범죄 관련 통계 자료보다는, 실제 범죄에 대한 세부사항과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 범죄의 개인적, 사회적 측면을 파악한다.
필자 역, David Canter, Criminal Psychology, Hodder Education, 2008. 4.
위 두 인용문에 따르면, 범죄심리학은 심리학의 하위 분야로, 사회심리학 혹은 임상심리학, 인지심리학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협의의 의미로는 수사심리학과, 교정심리학, 피해자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2016. 19-20) 특히, 주요하게 바라볼 점은, 데이비드 캔터에 의하면, 과정으로 이해하는 범죄인데, 범죄는 기본적으로 행위로 포착이 되어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 범죄 현상 속에서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로 구분이 생긴다. 이것은 범죄 활동의 근본 성격이 사회적임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에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존재하는, 즉, 인과원리로 접근이 가능한 과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범죄 중 스토킹 범죄가 있을 것이다.
하민경의 논문에 의하면, 스토킹을 관계중독(realation addiction)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관계중독이란 “특정 대상이나 그 관계에 집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그 대상이나 관계에 강박적으로 의존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2023. 105)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관계중독이라는 상태에서 행위가 붙어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켄터가 말한 “이전의 경험”과 “개인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이것은 해당 “범죄와 범죄자에게 매우 의존적”인 학문이 바로 범죄심리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심리학은 넓은 의미에서는 생물학과 사회환경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는 단 하나의 개별학문으로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포괄적인 학제간 연구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오윤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박영사, 2016.
- 하민경, 「관계중독과 범죄, 형사정책의 방향」,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3, 2, 2023.
- David Canter, Criminal Psychology, Hodder Education, 2008.
